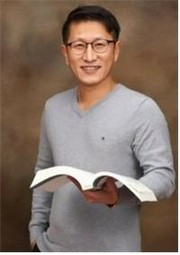
이 작품은 러시아 작가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1918~2008)의 자전적 소설이다. 솔제니친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당시 친구에게 스탈린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적발돼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한다. 1962년 문학지에 에 중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함과 동시에 소련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반체제 작가로 유명인사가 된다.
주인공은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로 40살이며 수용소 번호 췌-854, 104반원이다. 농부였던 그는 독일첩보원으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정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 자신이 어떤 반역죄를 저질렀는지 취조관도 슈호프도 모른다. 10년형을 받은 그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수용소에서 살아왔으며 아직도2년 남짓한 기간이 남아있다. 오랜 기간 수용소 생활을 해온터라 이제는 고향에 두고 온 아내의 얼굴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수용소 생활에 익숙하다. 간수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요령껏 조심’하는 생활은 몸에 익어있다.
바로 슈호프의 어느 겨울 하루가 이 소설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제목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이다. 소설은 하루에서 가장 춥다는 해뜨기 전부터 시작되며, 슈호프의 하루 일정을 마친 밤의 잠자리에서 슈호프의 독백으로 마무리 된다.
허허벌판 위 불모의 땅에 세워진 수용소, 영하 30도의 추운 날, 슈호프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용소와 작업장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른 아침 잠자리에서 이렇게 밍기적 거리다 당직 간수에게 노농 영창 3일을 선고받아 끌려간다. 하지만 당직 간수는 노동 영창으로 보내는 대신 간수 실 바닥청소만 시킨다. 불행 중 다행이다. 수용소 생활은 쉽지 않다. 그곳에서 내 몸 하나 온전히 간수하기 위해서는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한다. 점호를 하러 가는 순간-어둡고 춥고 배고프며 펼쳐질 고된 하루에 대한 생각으로 괴롭다. 점호시간 후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오늘 해야 할 작업에 대해 윗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죄수들은 불을 쬐며 잠시 ‘쫄깃한’ 자유시간을 갖는다.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중앙난방시설을 짓는 일이다. 슈호프에게는 이층 벽 벽돌쌓기가 주어졌다. 슈호프의 파트너는 라트비아인인 킬리가스이다. 두 사람은 손발이 잘 맞는 노련한 블록 공 들이다. 자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단체 상여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게을리 할 수 없다. 단지 이백 그램의 빵을 더 먹을 수 있을 뿐이지만 수용소의 모든 생활은 이백 그램 빵에 달려있다. 같은 반원들은 이백 그램 빵을 위해 뭉친 대가족이다. 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반장은 그들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요령껏 작업량을 결정해 괜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며, 이백 그램 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들에게 반장은 절대적이다.
점심 식사 후 반원들은 조를 나누어 반장과 함께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다른 잡생각은 나지 않는다. 오직 쌓아올릴 벽에만 집중한다. 가지각색인 벽돌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도 금 새 파악한다. 정신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 그들은 아예 추위를 잊고 땀에 흠뻑 젖어버렸다. 해질 무렵 슈호프 반원들이 쌓아올린 벽은 반듯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저녁점호에 문제가 생겼다. 인원수가 안 맞는 것이다. 허허벌판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죄수들은 빨리 수용소로 돌아가 몸을 녹이려는 생각을 체념한다. 죄수 인원이 맞자 경호대장은 빨리 걸어라 재촉하지만 죄수들은 이미 일찍 돌아가는 것은 체념한 터라 한마음인 냥 보조도 맞추지 않고 터벅터벅 천천히 걸어간다. 자신들을 가혹하게 대한 경호병들에 대한 복수이다. 하지만 언덕 너머 다른 곳에서 일한 작업대 죄수들이 보이자 슈호프가 있는 죄수들 대열이 마구 뛰기 시작한다. 이젠 종대 사이 경쟁이 붙어 죄수들과 합세해 경호병들까지 달린다. 벅찬 순간이다.
잠들기 전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오후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쌓기도 했다.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잎담배도 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찌뿌둥 하던 몸도 이젠 씻은 듯이 다 나았다. 눈앞이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었다.’
슈호프가 하루 종일 얻은 것은 소소한 것들이다. 줄칼 조각, 이백 그램의 여유 빵 한 조각, 잎담배. 그는 이런 작은 소득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 소소한 것을 얻었다는 기쁨은 크다. 그에게 더 큰 기쁨은 아버지 같은 반장의 지휘 아래 정신없이 땀날 정도로 작업장에서 벽돌을 쌓은 그날의 오후 시간이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되는대로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제대로 된 작업을 해낸 것이 뿌듯하다.
황량한 겨울 벌판에 세워진 한 수용소의 하루는 감히 생각치도 못한 하루다. 과연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고스란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이반 데니소비치를 보면서 나의 행복은 어떤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행복이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어찌 보면 건강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일지 모르고 일상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나는 어찌 살고 있을까. 어쩌면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