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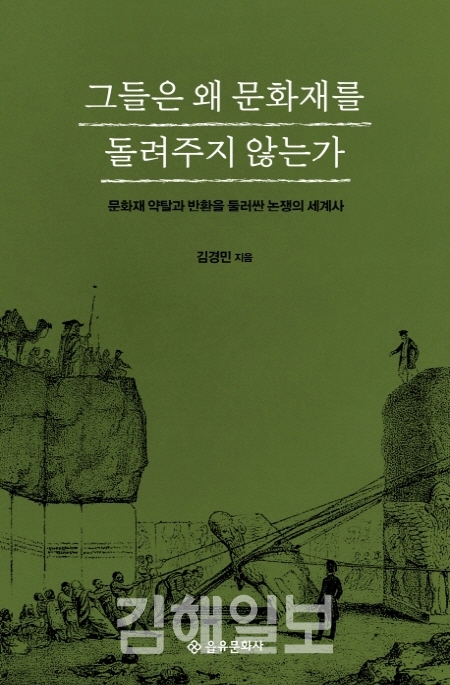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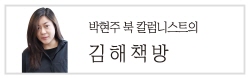
1800년대 초, 영국의 귀족 토머스 브루스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해체했다. 해체한 뒤에는 200t에 달하는 대리석 조각을 당시 세계 최강이던 영국 해군 함정에 실어서 영국으로 당당하게(뻔뻔하게) 가져갔다. 문화재 해체 약탈 규모가 참으로 대담하고 크다. 이 경우는 문화재 약탈에 개인뿐 아니라 영국 정부의 영향력이 방대하게 작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문화재 약탈과 반환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익숙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일을 떠올려보자. 2011년,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에서 돌아왔다. 당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에 관한 사연과 과정들은 책으로도 나와 있다. 그런데 의궤는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일괄 대여 형식'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약탈해 간 문화재이니까 소유권까지 완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단순 논리로는 접근할 수 없다.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는 말할 것도 없다.
유네스코는 1970년, 불법 문화재 반입과 반출·소유권 양도를 금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이전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당사국이 아니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재 환수는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 논의 자체가 문화재 약탈국에 유리한 것이다. 문화재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문화재 약탈 문제는 제국주의 팽창과 맞물려 있다.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소유하는 행위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했다. 이러한 행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인 나라가 영국이다. 대영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유물이 그 증거이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재가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다.
문화재 약탈국들은 훔쳐간 것에 대해 사과는커녕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이고, 자신들 덕분에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한다. 의궤를 반환받을 때 우리나라도 프랑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들은 '한국이 의궤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되느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약탈국들은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식민지 시대의 피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 중 하나가 어쩌면 문화재일지도 모른다. 나라는 독립했을지언정, 약탈한 문화재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뺏긴 상태이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 논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지 빼앗기고 빼앗는 문제가 아닌 역사적 배경·사회적 의미·경제적 가치가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예술과 문화가 집중된 수준 높은 작품이다. 그래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보다. 어디에 있으나 인류역사의 공동유산이라는 약탈국들의 변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계적으로 약탈당한 문화재,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책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의 세계사를 들려준다.

